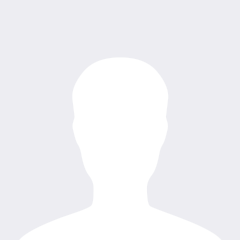따악-
딱-!
아차산의 어느 언덕. 한 열일곱 살 소년이 휘두른 도끼가 나무를 찍어대는 소리가 맑고도 청아하게 울려퍼졌다.
도끼를 든다.
휘두른다.
내리친다.
동작은 단지 이것뿐이지만,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쉬워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조금이라도 엉뚱한 곳을 가격하면 도끼가 빗나가 나무껍질에 명중하게 되고, 그랬다간 팔에 무자비하고 가차 없는 반동이 가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년은 이 일을 벌써 6년째 해 온 탓에 이제는 그런 일을 겪는 빈도가 열다섯 번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다.
"여덟...... 아홉......!!"
소년이 아홉 번째로 도끼를 휘두르자,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떡갈나무 하나가 넘어가더니 이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소년은 그제서야 도끼를 내려놓고 밀색에 가까운 회갈색의 머리카락과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가죽 물주머니를 꺼내 물을 시원하게 마셨다.
그런 그를 보며, 옆에 있던 졸참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던 한 흑발의 소년이 박수를 차며 말했다.
"이야, 제법인데? 역시 아무리 연습해 봐도 제오, 네 도끼 솜씨는 못 따라가겠다니까."
흑발 소년은 고구려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지만, 그의 억양은 고구려인의 억양이 아니었다. 백제인의 억양도, 신라인의 억양도 아니었고, 가야인의 억양 또한 아닌 기묘한 억양. 거기다가 흑발 소년의 이목구비는 고구려인버단 백제인에 좀 더 가까웠다.
하지만 제오라 불린 밀색 머리카락의 소년은 그런 걸 전혀 신경쓰지 않고 소년에게 웃으며 말했다.
"뭐, 언젠가 너도 연습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 뭣보다 지금도 많이 부족해."
그렇게 말하던 제오는 흑발 소년에게 궁금한 게 있는 듯 질문을 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하늘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서기 2023년이라는 시간에서 왔다고 말했지? 근데 그 서기 2023년이란 건 태왕력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확히 몇 년인 거야?"
하늘은 잠시 계산을 해 보더니 말했다.
"음, 태왕력 원년을 서기로 변환하면 기원전 37년이니까, 2023에 37을 더하면.... 아, 태왕력 2060년이네."
그 말을 들은 제오는 놀라면서도 이내 곧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천오백 하고도 오십 년... 확실히 그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 고구려도, 백제도, 그리고 신라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만 하겠구나.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슬퍼지네."
제오가 그렇게 말하자 하늘은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고구려가 사라지고도 천 년이 훨씬 지난 미래에서 왔다 보니, 이 나라의 운명을 모두 알고 있는 자신으로써는 그에게 해줄 말이 달리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해줄 말을 떠올린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적어도 내가 알던 역사대로 흘러간다면 네가 죽기 전까지는 고구려가 멸망하진 않겠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듣자 제오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는지 말했다.
"음, 그 말이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둘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또 농땡이 피우는 거야?!”
제오는 자기도 모르게 목을 움츠리며 등 뒤를 돌아보았다. 슬쩍 옆을 보니 하늘도 그처럼 긴장한 듯했다. 그곳에는 허리에 두 손을 댄 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있는 두 사람 또래의 소녀가 보였다. 제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소녀의 눈에는 그의 미소가 어색해 보이는 듯했다.
"아... 치희구나? 적어도 나는 농땡이 피우는 거 아냐. 봐, 이건 방금 쓰러뜨린 나무잖아?"
"으~음, 확실히 그건 부정 못 하겠네. 하지만, 이 나무를 찍어넘긴다고 끝이 아니라고! 나무를 쪼개지 않으면 땔감으로도 숯으로도 목재로도 못 쓴다는 건 너도 알잖아!"
"아...하하, 그렇네."
때마침 산들바람이 불자, 치희의 머리카락이 햇살에 닿아 금빛을 띠는 갈색을 뿜으며 나부꼈다. 그녀는 뒤쪽으로 길게 한 갈래로 땋은 찰랑거리는 갈색 머리와 아름다운 호두색의 눈동자가 인상적인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미모는 한눈에 보기에도 또래의 여느 여자아이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지만, 제오와 하늘에게 있어 그녀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내 한숨을 내쉬더니 이고 온 새참 바구니을 펼쳤다. 바구니 안에 든 것은 차조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소금에 절인 오이 김치였다. 세 명의 소년소녀들은 이윽고 일제히 식사를 시작했고, 밥 공기를 싹 비울 때까지 세 사람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밥공기를 비운 것은 제오였다. 그는 젓가락으로 소금에 절인 오이를 한 조각 집고 꼭꼭 씹어 삼킨 뒤 말했다.
"그나저나 요 몇 달 동안은 백잔 쪽이 조용하네. 드디어 녀석들도 여길 탈환하는 걸 단념한 건가 봐."
치희 역시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확실히 그런 거 같아. 덕분에 요 몇 달 동안 되게 편했던 거 같아.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매일매일 계속되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하늘은 그 말을 듣자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아냐, 뭔가 이상해.'
확실히 몇 달 동안 백제는 이 마을을, 아차산 부근을 침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를 서기로 환산하면 473년. 백제의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인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에게 참수당하고 백제가 한 번 멸망 직전까지 몰릴 정도로 궤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후이다. 거기다가 마을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가 태왕력 493년에 백제의 편으로 돌아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이는 곧 나제동맹을 뜻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급박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인근인 이 마을이 몇 달 넘게 침공을 안 당했다는 건...
'오히려 백제가 대규모로 침공을 준비 중인 걸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