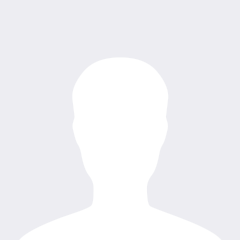내 여동생은 조현병 환자다.
언제부터 조현병에 걸렸는지는 모른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여동생 친구들, 담임도 모른다. 본인도 자기가 언제부터 조현병에 걸렸는 지 모를 것이다.
"오빠, 저 초밥 같은건 뭐야? 오빠 지금 먹고 있는거."
"초밥 맞아."
"옆에 간장 같은건?"
"간장이지."
여동생은 조현병 때문에 제 때 제 때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여동생은 늘 약 먹는 걸 거부하고 있다. "너 약은 잘 챙겨먹고 다니는 건 맞지?"라고 물어보면 늘 이상한 말을 늘어대면서 약 먹는 걸 거부하고 있다.
"아니 오빠, 그 약 먹으면 안된다니깐? 그거 먹으면 윗집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말하는거 도청한다고."
우리 집은 맨 꼭대기 층이다. 어제는 아들 둘과 과부 한 명만 사는 옆집에서 조선족이 우리 집에 찾아와 본인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일 거라고 일주일을 벌벌 떨었으며, 그저께는 저번 주에 이사가고 텅 빈 아랫집에서 우리가 위험한 약을 복용하고 있을 거라고 오해해 우리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약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려 했다. 여동생은 늘 이런 기상천외한 헛소리들을 사실인 양 늘어놓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대화, 나는 견디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장담하건대 그 때의 나는 이런 대화 절대로 못 견뎠을 것이다. 어떤 정상인이 이런 대화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대화를 1년 365일 24시간 1,440분 86,400초 내내 들을 수 있을까? 그토록 자비롭다던 부처님도, 원수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기꺼이 내주라던 그 예수님도 내 여동생과의 대화를 포기했을 것이 분명하다.
"오빠. 오빠."
여동생이 속삭이면서 말했다.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스파이가 임무를 전달하듯이 날 부르고 있으니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할 게 분명하다.
"어, 왜."
여동생은 손가락으로 살짝 건너 건너편 테이블을 가리켰다.
"방금 저기 양복입은 여자가 저 쪽 손님 물컵에 독을 따르고 있었어!"
건너 건너편 테이블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던 웨이트리스가 손님에게 물 한 컵을 따라주고 있었다. 여동생은 내가 마시던 물컵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가 마신 물에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뱉으라고 재촉했다.
지난주에는 엄마가 달걀계란밥에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르자 저 여자가 우리 밥에 독을 부었다고 들고 있던 쇠숟가락을 밥에 푹푹 꽂아댔으며(물론 밥이 보라색이 되는 일은 없었다. 될 리가 없지.), 그저께 피자집에 갔을 때에는 아빠가 여동생의 컵에 사이다를 부어주자 사이다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고 소리를 질러대 피자집에서 쫒겨났었다. 여동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늘 경계했으며, 이런 여동생이 자신이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엄청난 근거랍시고 내밀던 것들은 철가루로 위장한 김가루, 면도날을 품고 있는 사과(그 때 여동생이 내민 사과는 어제 막 시장에서 사온 사과였다.), 가루수면제로 위장한 피자 치즈같은, 기괴하고 요상한 본인의 망상덩어리 일부들이었다.
"어, 그래. 독약이네. 근데 난 해독제를 먹어서 괜ㅊ.."
"지금 독 그런게 중요해? 17월 43일 월요일에 거대한 문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건물들을 휘감을 거라고!"
여동생이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문어. 그것도 하늘을 나는. 그런게 이 세상에 있을리가 없잖아.
"문어라.. 재밌는 발상이네.."
내가 여동생의 외침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자 여동생은 그런 문어는 실존하다고, 하늘에 저 문어가 보이지 않냐고 소리쳤다.
환각과 환청,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우리는 그런 조현병 환자들의 환각과 환청이 믿기지 않겠지만, 조현병 환자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직접 바라보고, 무언가를 직접 듣는 것 처럼, 매우 생생하게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다 한다.
지금의 여동생이 너무 강렬한 탓에 기억은 제대로 안 나지만, 내가 어린 시절 본 여동생은 귀엽고, 늘 얌전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이런 여동생이 우리가 모르는 새, 본인도 모르는 새 이런 병에 걸리고 말아버렸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으며, 내 기억 속 그렇게 정상적이던 여동생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너무나도 두려웠다.
나는 사이좋고 쿵짝 잘 맞는 그런 이상적인 여동생을 원하지 않는다.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운동 잘하는 그런의 만능 여동생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냥 이런 환청, 환각 겪을 일 없이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여동생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냥 가만히 앉고 먹던 거나 먹자.."
오늘은 여동생이 가장 먹고싶어 했던 초밥 몇 점 먹기 위해 오랜만에 외출한 날. 조금이나마 평온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초밥을 먹고 싶었던 내 새싹같던 작은 소망은 조현병이라는 거대한 부츠에게 수 십번을 짓밟혀 버렸다.
"..그나저나 오빠는 왜 가면을 쓰고 있어?"
또 환각.
"어.. 어? 무슨 가면? 내가 지금 가면 쓴 것 처럼 보여?"
난 내 얼굴을 만지작대며 되물었다.
"오빠 뿐만이 아니야. 모두가 나만 쏙 빼놓고 하얀 가면을 쓰고 있어. 저기 저 여자는 가면에 장미도 그려놓고, 오빠가 쓰고 있는 가면에도 백합이 그려져 있잖아."
여동생은 자기 얼굴을 만지작대며 말했다.
"근데 난 가면이 없잖아. 가면을 썼다면 말랑말랑한 피부가 느껴질 리가 없잖아. 다들 밥 다 먹고 무도회라도 가려는거야? 나만 쏙 빼놓고?"
난 그저 고개를 푹 숙여 한숨을 팍 내쉴 뿐이다.
"그 가면 안 쓸거면 나 줘. 나 백합 좋아해."
"..그냥 자리에 앉어."
"싫어."
"앉으라고.."
"가면 주기 전 까진 안앉을거야."
"좀 자리에 앉으라고!"
결국 터져버렸다. 나는 부처도, 예수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인 나도 결국 이렇게 터져버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라도 오래 버틴 내가 한편으론 장하기도 했다.
"..오빤 왜 나만 미워해?"
"오빤 내가 이런 이상한 말만 해대는 년이라 싫은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싫은거야? 그냥 죽어줄까? 여기에서 창문 깨고 떨어지면 만족할거야? 응?"
이대로 더 가다간 나도 미쳐버리는 건가? 이미 미쳐버린건가? 이미 미쳐버린게 맞을 지도 모르겠다.
30초 정도의 정적이 나와 여동생을 감쌌다.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또 언제였던가?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 평생. 평생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다.
"오빠."
"..왜."
내가 힘 없이 답했다.
"저 쌍년이 또 컵에 독을 따르고 있어. 이젠 우리 컵에도 독을 따를지도 몰라."
"오빠. 저 쌍년 좀 어떻게 해 줘. 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싸그리 꺼낸 뒤에 저 년 입에 쑤셔넣어줘. 다시는 저 독 담긴 병따윈 들고다니지 못하게 손모가지 싹 다 토막내버리고, 저런 독 맛을 직접 느끼게 혓바닥을 잘라 독에 담가버리는 거ㅇ.."
"작작 좀 해, 이 씨발 좆같은 년아!!!!"
저 멀리서 웨이트리스가 깜짝 놀라서 달려와 정중히 물었다.
"손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깜짝 놀라 이성을 되찾고 분노를 마음 한 켠에 꾹꾹 우겨넣었다.
"아.. 소란 피위서 죄송합니다.. 여동생이랑 말싸움 좀 하느.. 어?"
여동생이 보이질 않는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내가 소리쳐서 돌아가 버린건가? 후회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다. 그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텐데.
"저.. 손님..?"
"손님은 같이 오신 일행분이 없으셨습니다만.."
"아뇨.. 저 분명 여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당황하며 고개를 올려다봤다.
양복을 입고 있던 그 여자는 장미가 그려진 하얀 가면을 낀 채 날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가면을 낀 모두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소름끼치는 감정은 처음 느껴본다.
"진짜 모르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건 다 저 년이 먹인 독 탓이야. 독 탓이야. 독 탓이야."
그래.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전부 그 년이 먹인 독 탓이다. 독 탓이야. 전부 그 창년새끼가 먹인 독 탓이라고.
"그래 맞아! 전부 저 년이 먹인 독 탓이야."
"그 년 배를 갈라버려. 저 년 내장을 싸그리 꺼낸 뒤에 그 망할 입에 쑤셔넣어버려. 손모가지를 싹 다 토막내버리고, 혓바닥을 잘라 독 병에 담가버리는거야!"
나는 나이프를 들었다.
창 밖에선 태양 아래 거대한 문어 무리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우렁찬 목소리로 찌렁찌렁 거대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원작 : 고랭순대 - 합리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undaemaster&logNo=221572509299&navType=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