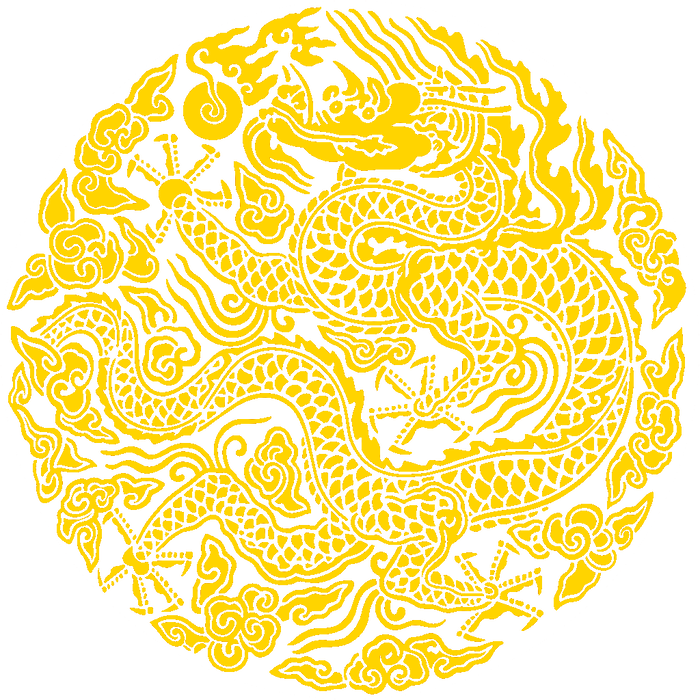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도화 | {{도화 조선 스킨}} | ||
{{도화 머릿말}} | {{도화 머릿말}} | ||
{{조선 관련 문서}} | |||
{{조선의 연호/경성}} | {{조선의 연호/경성}} | ||
| 47번째 줄: | 46번째 줄: | ||
八千里江山, 是謂大同也。 | 八千里江山, 是謂大同也。 | ||
</div>{{개행 금지 끝}} | </div>{{개행 금지 끝}} | ||
<div class="JO-WebDisplay"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7px auto -10px | <div class="JO-WebDisplay"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7px auto -10px -75px;width:100%;text-align:left;"><div style="width:fit-content;display:inline-block;">[[파일:조선대동지곡.mp3]]{{여백|5px}}{{툴팁/도화|재해석|1910년 대한예악사 공연; 서양식 재해석}}</div></div><div class="JO-MobileDisplay"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7px auto -10px 0px;width:100%;">{{V|0}}[[파일:조선대동지곡.mp3]]</div></div></div> | ||
|- | |- | ||
|}</div></div> | |}</div></div> | ||
{{V|5}}{{앵커|개요}} | {{V|5}}{{앵커|개요}} | ||
<div style="width:100%;text-align:left;font-size:11px;word-spacing:1px;border-top:1px solid rgba(158,8,33,.5);border-bottom:1px solid rgba(158,8,33,.5);padding:15px 25px;color:rgba(235,193,82,.6);font-family:GmarketSansMedium, 'Pretendard JP Variable';letter-spacing:1px; background:#9e0821;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rgba(0,0,0,0.2) 0%, rgba(0,0,0,0) 50%, rgba(0,0,0,0.2) 100%), linear-gradient(to right, rgba(0,0,0,0.3), rgba(0,0,0,0.3));text-shadow:0px 0px 2px rgba(0,0,0,0.35);border-radius:10px;box-shadow:0px 0px 3px rgba(0,0,0,.3);border: | <div style="width:100%;text-align:left;font-size:11px;word-spacing:1px;border-top:1px solid rgba(158,8,33,.5);border-bottom:1px solid rgba(158,8,33,.5);padding:15px 25px;color:rgba(235,193,82,.6);font-family:GmarketSansMedium, 'Pretendard JP Variable';letter-spacing:1px; background:#9e0821;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rgba(0,0,0,0.2) 0%, rgba(0,0,0,0) 50%, rgba(0,0,0,0.2) 100%), linear-gradient(to right, rgba(0,0,0,0.3), rgba(0,0,0,0.3));text-shadow:0px 0px 2px rgba(0,0,0,0.35);border-radius:10px;box-shadow:0px 0px 3px rgba(0,0,0,.3);border:1px solid #ba001f;margin-bottom:15px;"> |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margin-bottom:10px;color:rgba(235,193,82,.8);font-weight:bold;">1. 개요</div> | <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margin-bottom:10px;color:rgba(235,193,82,.8);font-weight:bold;">1. 개요</div> | ||
《대동지곡》은 | 《대동지곡》은 조선에서 제정된 국가(國歌)로, 유교 경전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에 등장하는 ‘대동세계(大同世界)’ 사상을 기반으로 작사된 시가이다. 이 노래는 조선이 추구하는 이상사회, 즉 공공에 기반한 도덕정치, 신의와 화목, 상호부양의 공동체, 그리고 도덕적 실천을 담은 교육국가의 이념을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총 3절로 이루어진 이 가사는 각 절마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조선의 문명적 이상과 민족적 자부심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 ||
《대동지곡》은 영종 시기, 대동사회 구현을 국가적 기조로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작사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관청, 기관에서 활동하던 작가군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노래는 단순한 국가의 역할을 넘어, 조선의 통치철학과 시민정체성, 교육이념, 외교적 기조까지 포함하는 선언문적 성격을 가진다. | 《대동지곡》은 영종 시기, 대동사회 구현을 국가적 기조로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작사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관청, 기관에서 활동하던 작가군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노래는 단순한 국가의 역할을 넘어, 조선의 통치철학과 시민정체성, 교육이념, 외교적 기조까지 포함하는 선언문적 성격을 가진다. | ||
| 71번째 줄: | 70번째 줄: | ||
결론적으로 《대동지곡》은 조선의 국가 정체성, 문명관, 통치 철학, 교육 이념, 문화 양식, 외교 전략을 모두 압축한 하나의 상징체계이며, 그것은 동시에 조선이 실현해낸 "대동세계"의 음성적 구현이자, 백성과 국가, 천하의 일체화를 선언하는 이상국가적 주제곡이다. | 결론적으로 《대동지곡》은 조선의 국가 정체성, 문명관, 통치 철학, 교육 이념, 문화 양식, 외교 전략을 모두 압축한 하나의 상징체계이며, 그것은 동시에 조선이 실현해낸 "대동세계"의 음성적 구현이자, 백성과 국가, 천하의 일체화를 선언하는 이상국가적 주제곡이다. | ||
</div> | </div> | ||
{{도화의 문서}} | |||
</div> | </div> | ||
2025년 8월 3일 (일) 03:41 기준 최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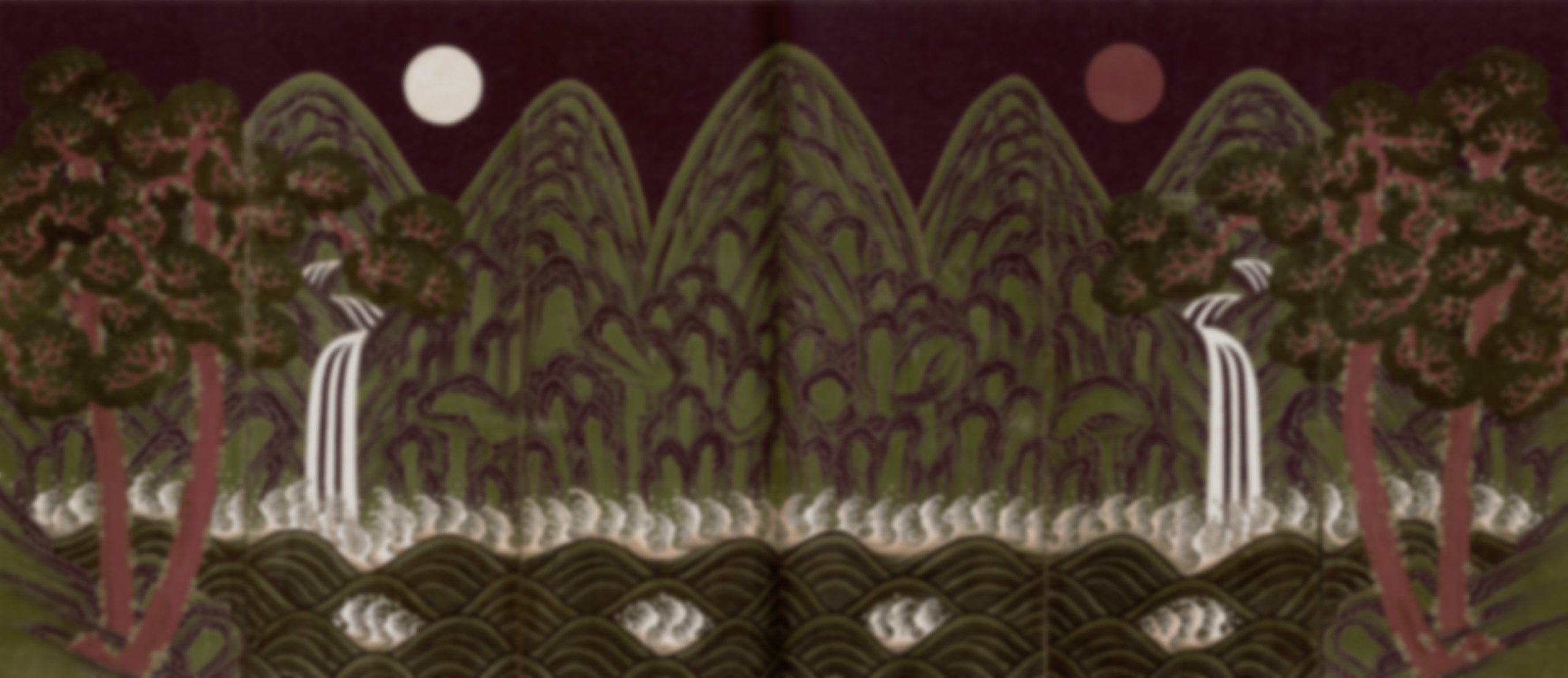
《대동지곡》은 조선에서 제정된 국가(國歌)로, 유교 경전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에 등장하는 ‘대동세계(大同世界)’ 사상을 기반으로 작사된 시가이다. 이 노래는 조선이 추구하는 이상사회, 즉 공공에 기반한 도덕정치, 신의와 화목, 상호부양의 공동체, 그리고 도덕적 실천을 담은 교육국가의 이념을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총 3절로 이루어진 이 가사는 각 절마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조선의 문명적 이상과 민족적 자부심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동지곡》은 영종 시기, 대동사회 구현을 국가적 기조로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작사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관청, 기관에서 활동하던 작가군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노래는 단순한 국가의 역할을 넘어, 조선의 통치철학과 시민정체성, 교육이념, 외교적 기조까지 포함하는 선언문적 성격을 가진다.
제1절은 정치와 사회질서를 주제로 한다. "대도가 행하매 천하는 곧 만민이라"라는 첫 행은 고전 경전의 구절을 충실히 재현하면서, 모든 백성이 공공의 이치에 따라 통치되는 세상을 선언한다. 이어지는 "군자는 지혜와 재주를 널리 펼치라"는 문장은 능력주의와 도덕적 리더십을 중시하는 조선의 인재등용 철학을 표현하며, "신의와 화목은 저절로 맺어지리라"는 문장은 조선 사회의 핵심 윤리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조화를 강조한다.
제2절은 가정과 공동체 윤리를 노래한다. 여기서 "천하는 곧 가정이네"라는 구절은 『예기』 예운편의 "사람은 오직 자기 부모만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기르지 않는다"는 구절을 재해석한 것이다. 즉, 조선은 혈연 중심의 협애적(狹隘的) 가족개념을 넘어선 보편가족주의를 추구하며, 상호부양과 공동체적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국가임을 드러낸다. 이 절은 조선이 민본주의와 공동체 윤리를 제도화하고, 백성 모두를 국가의 구성원으로 포섭하고자 했던 정책적 이상과 직결된다.
제3절은 교육과 도덕 실천을 주제로 하며, 조선의 교육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천하는 곧 사람이라"는 구절은 천하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유학적 인간주의를 함축하고 있으며, "어려서 인의와 자애로 장성하리라 / 자라나 충효와 대의를 실천하리라"는 구절은 전 생애에 걸친 민중의식가 윤리체계를 보여준다. 이는 실제로 조선의 교육체계, 그리고 백성에게 요구된 실천윤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대동지곡》은 조선의 국가 운영 방식 및 외교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상제 등 조선 고유의 정치체계와 부합하는 이상국가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민의와 능력을 중시하는 통치철학과, 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교육을 통한 인성 계발과 도덕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이념을 노래한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조선이 경국을 비롯한 주변 문명국들 사이에서 ‘문명 중심국’, 즉 도덕과 질서를 대표하는 패국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이 국가가 외교적 선언문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대동"이라는 어휘는 조선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조선의 사상적 정통성과 문명적 우위를 상징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백성들에게 《대동지곡》은 단순한 국가 제창을 넘어서 삶의 이념과 공동체의 윤리를 내면화하는 교육적 도구였다. 이 노래는 각종 국가 중대 행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연주되었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되었다. "대동세계" 또는 "대도지행 천하위공(大道之行 天下爲公)" 라는 구절은 국가 표어의 일종으로 표현되었다. 조선인들에게 ‘대동’은 이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당연한 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문화적으로도 《대동지곡》은 단지 국악의 한 양식을 넘어 민속음악과 창극, 병창 등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었으며, 이후 서양 관현악 악보, 정간보 등으로도 정리되어 국가적인 음악유산으로 남았다.
결론적으로 《대동지곡》은 조선의 국가 정체성, 문명관, 통치 철학, 교육 이념, 문화 양식, 외교 전략을 모두 압축한 하나의 상징체계이며, 그것은 동시에 조선이 실현해낸 "대동세계"의 음성적 구현이자, 백성과 국가, 천하의 일체화를 선언하는 이상국가적 주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