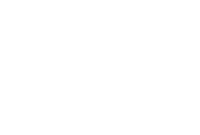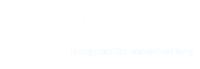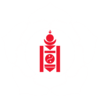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148번째 줄: | 148번째 줄: | ||
몽골의 국가는 몽골 국가로 구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의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몽골의 국가는 몽골 국가로 구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의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
==역사== | ==역사== | ||
===몽골 내전=== | ===[[몽골 내전 (민국 38)|몽골 내전]]=== | ||
국공내전이 국민당의 슬리로 귀결된 이후 국가가 안정하되자 당시 중국의 총통이였던 장제스는 북부의 몽골을 | [[파일:몽골 내전 중국군 전차.jpg|섬네일|왼쪽|몽골 내전 당시 중국군 전차]]국공내전이 국민당의 슬리로 귀결된 이후 국가가 안정하되자 당시 중국의 총통이였던 장제스는 북부의 몽골을 노리고 있었는데, 1945년 이전까지 몽골은 명목상 중화민국의 몽고 지방이였고<ref>당시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 직할시, 지방으로 나뉘였는데 성과 직할시는 현재와 같고 지방은 티베트, 몽골에 설치하는 행정구역이였다. 몽고 지방은 1945년 이후 폐지되었고 시짱(티베트) 지방은 56년 티베트 합병이후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82년 신헙법 공포와 함께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완전히 폐지되었다.</ref><ref>시짱 지방은 이후 시짱성으로 편입되었으나 인도 지배하에 있는 남티베트 일대는 계속 시짱 지방으로 남아있다가 행정구역 개편이후 티베트 자치성으로 편입되었다.</ref> 몽고 지방 폐지 이후에도 장제스는 몽골 지배권의 탈환을 마음에 담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와중 1956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화였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티베트 침공은 매우 쉽게 끝났으며 소련을 비롯한 어떤 국가도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지 않자 장제스와 중국 정부는 고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점차 몽골 침공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몽골이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하다고 해도 티베트 정도는 발라버릴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이였고 무었보다 소련의 보호국이였으며 소련군 제39군 사단이 주둔중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우선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이기 위하여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라는 몽골 남부 우므느고비주에 주둔하고있던 몽골군 장교를 중심으로 국경경비대 일부와 남부 주둔군 일부를 매수해 몽골 내부의 반란이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다. 이후 1956년 4월 7일에 일명 장제스 독트린이라 불리는 아시아 민족선언을 발표, 아시아 영내의 외국군 주둔은 오로지 아시아 민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하며 소련을 비난했다. <del>미국 의문의 1패</del> 그리고 5월 1일,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의 혁명선언을 필두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내전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가세했고 중국언론들은 이를 공산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디 위한 성전으로 포장했고 각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군을 이끌고 개입을 시작하자 중국은 을지바타르를 사주하여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시켰고 그렇게 약 10만의 중국군 병력이 월경하며 전쟁은 장기전이 되어갔다. 한편 당시 소련에서는 처녀지 개간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력을 처녀지 개간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에 그렇게 큰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고 국내여론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측도 이대로 전쟁을 더 끌기에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협상에 응했고 인도와 한국의 중재하에 울란바로르 협정이 이뤄졌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 ||
=== | {{인용문|몽골 민주군 총사령관 및 중국국민의용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몽골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소련 제39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몽골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br> | ||
# 해당 협정은 발효된 직후부터 유효하다. | |||
# 해당 협정의 체결이후 소련 및 중국군을 비롯핸 제3국의 군대는 100년간 몽골에 주둔 할 수 없다. | |||
# 몽골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여부는 몽골 인민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 |||
# 기존 몽골 인민군과 민주군을 통합시켜 신정부 하에 둔다. | |||
# 소련, 중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도 몽골을 자국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몽골 인민의 자주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 |||
|1956년 12월 21일 몽골 민주군 총사령관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 / 중국국민의용군 사령원 두위밍<br> | |||
몽골 인민군 최고사령관 잠스랑인 삼부 / 소련 제39군 사령원 세묜 부됸니}} | |||
===냉전시대와 현재=== | |||
[[파일:몽골혁명.png|섬네일|오른쪽|1987년 몽골 혁명 당시 정부광장의 시위대]]정전이후 몽골에는 체제개변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약 5 : 3 정도의 비율로 체제개변이 가결되었으며 국명을 몽골 민주공화국으로의 국호 변경이 확정되었다. 초반에는 소련과 중국의 신경전 속에서 민주적인 체제가 들어서나 했으나 처녀지 개간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소련에 정치혼란이 찾아오자 중국은 의회내 쿠데타를 사주, 친소파 총리를 실각시키고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한다. 그 이후 친중파 몽골 혁명당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가 이루어졌다. 몽골 혁명당은 중국식 중앙집권체제와 대통령제를 표방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했고 실제로 이시기에 몽골에 중공업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또한 높아저 갔고 장제스의 사망으로 1975년에 [[1975년 중국 민주혁명 (민국 38)|혁명]]이 일어나자 몽골 혁명당 정부또한 체제 개변을 선언, 점진적인 민주화를 약속한다. 그러나 민주화가 더디게 진행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이 사건을 1987년 몽골 혁명이라고 불린다. 몽골 혁명이후 혁명당 정권은 무너졌으며 민주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정치== | ==정치== | ||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리의 힘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우파 -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과 중도좌파 - 사민주의 성향의 인민당이 대립한다. 보수당, 국민노동당, 혁명당등의 정당도 존재하나 큰 영향력은 없다. | ||
===입법부=== | ===입법부=== | ||
{{ | {{몽골 국가대회의의 원내구성 (민국 38)}} | ||
''' | '''몽골 국가대회의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는 몽골의 입법부로 단원제 의회다. 26개 선거구에서 48명, 비례대표로 28명을 선출히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
==외교== | ==외교== | ||
=== | ===한몽관계=== | ||
중국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건사고와 접점은 없지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 | ===중몽관계=== | ||
중국과 유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몽골이니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구 몽골내전의 발단을 중국이 제공했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는 편이다. | |||
===몽유관계=== | |||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 |||
=== | |||
==각주== | ==각주== | ||
2021년 8월 5일 (목) 13:53 판
[ 국가 목록 ]
|
[ 세계관 소개 ]
|
[ 문서 목록 ]
| |

|
|
[ 펼치기 · 접기 ] |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Ардчилсан Монгол Улс | |||||||||||||||||||||||||||||||||

|

| ||||||||||||||||||||||||||||||||
|---|---|---|---|---|---|---|---|---|---|---|---|---|---|---|---|---|---|---|---|---|---|---|---|---|---|---|---|---|---|---|---|---|---|
| 국기 | 국장 | ||||||||||||||||||||||||||||||||
| 국민을 위한 국가 ард түмэнд зориулсан улс | |||||||||||||||||||||||||||||||||
| 상징 | |||||||||||||||||||||||||||||||||
| 국가 | 몽골 국가 [1] | ||||||||||||||||||||||||||||||||
| 연꽃 | |||||||||||||||||||||||||||||||||
| 역사 | |||||||||||||||||||||||||||||||||
|
[ 펼치기 · 접기 ]
| |||||||||||||||||||||||||||||||||
| 지리 | |||||||||||||||||||||||||||||||||
|
[ 펼치기 · 접기 ]
| |||||||||||||||||||||||||||||||||
| 인문환경 | |||||||||||||||||||||||||||||||||
|
[ 펼치기 · 접기 ]
| |||||||||||||||||||||||||||||||||
| 하위 행정구역 | |||||||||||||||||||||||||||||||||
|
[ 펼치기 · 접기 ]
| |||||||||||||||||||||||||||||||||
| 정치 | |||||||||||||||||||||||||||||||||
|
[ 펼치기 · 접기 ]
| |||||||||||||||||||||||||||||||||
| 경제 | |||||||||||||||||||||||||||||||||
|
[ 펼치기 · 접기 ]
| |||||||||||||||||||||||||||||||||
| 단위 | |||||||||||||||||||||||||||||||||
|
[ 펼치기 · 접기 ]
| |||||||||||||||||||||||||||||||||
| 외교 | |||||||||||||||||||||||||||||||||
|
[ 펼치기 · 접기 ]
| |||||||||||||||||||||||||||||||||
| ccTLD | |||||||||||||||||||||||||||||||||
| .mn | |||||||||||||||||||||||||||||||||
| 국가 코드 | |||||||||||||||||||||||||||||||||
| 496, MN, MNG | |||||||||||||||||||||||||||||||||
| 전화 코드 | |||||||||||||||||||||||||||||||||
| +976 | |||||||||||||||||||||||||||||||||
개요
몽골 민주공화국(Бүгд Найрамдах Ардчилсан Монгол Улс, Democratic Republic of Mongolia) 혹은 줄여서 몽골(Монгол, Mongolia)는 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공화국이다.
1911년 독립이후 192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들어섰으나 1956년 중국 장제스 정권의 지원하에 반정부군이 내전을 일으켜 승리한 후 현재의 국명으로 변경 뒤 중국의 괴뢰정권이 세워졌다. 이후 몽골 혁명당의 일당독재가 이어져오다가 1987년 몽골혁명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몽골 인민당과 혁명당의 양당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80 - 90년대를 전후하여 민주당이 부상하며 인민당 - 민주당의 양당제 국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임 대통령은 할트마긴 바트톨가이며 총리는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이다.


국가 상징
국명
공식적인 국호는 몽골 민주공화국(Бүгд Найрамдах Ардчилсан Монгол Улс, Democratic Republic of Mongolia)이며 보통 줄여서 몽골(Монгол, Mongolia)이라고 부른다. 이전 사회주의 국가 시절 국호는 몽골인민공화국 이였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몽골국이나 몽골 공화국등의 국호도 고려되었으나 무산되었다.
국기
 몽골국기 Монголын далбаа | |
|---|---|

| |
| 지위 | 공식 국기 |
| 채택일 | 1957년 1월 13일 |
| 근거 법령 | <몽골 국가에 대한 법률> |
| 비율 | 2:1 |
유라시아 연합의 국기는 몽골 국기이며 1957년 몽골 민주공화국 임시국회에 의해 재정되었다 파랑 - 하양 - 빨강으로 이루어진 가로 삼색기이며 좌측 상단에는 흰색 소욤보 문양이 들어가 있다. 파랑은 용맹과 지혜를, 하양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빨강은 전통과 국민 (몽골인)을 상징한다.
국장
 몽골국장 Монгол Улсын сүлд | |
|---|---|

| |
| 지위 | 공식 국장 |
| 채택일 | 1957년 1월 13일 |
| 사용처 |
|
몽골의 국장은 1957년에 재정되었다. 국장 가운데에는 파란색 바탕에 몽골의 전통적인 문양인 소욤보로 장식된 말이 달리고 있는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국장 위쪽에는 찬드마니 문양이 그려져 있다.
국가
 몽골 국가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ийн дуулал | |
|---|---|
| 지위 | 공식 국가 |
| 채택일 | 1950년 --월 --일[1] |
몽골의 국가는 몽골 국가로 구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의 선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
몽골 내전

국공내전이 국민당의 슬리로 귀결된 이후 국가가 안정하되자 당시 중국의 총통이였던 장제스는 북부의 몽골을 노리고 있었는데, 1945년 이전까지 몽골은 명목상 중화민국의 몽고 지방이였고[2][3] 몽고 지방 폐지 이후에도 장제스는 몽골 지배권의 탈환을 마음에 담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와중 1956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화였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티베트 침공은 매우 쉽게 끝났으며 소련을 비롯한 어떤 국가도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지 않자 장제스와 중국 정부는 고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점차 몽골 침공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몽골이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하다고 해도 티베트 정도는 발라버릴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이였고 무었보다 소련의 보호국이였으며 소련군 제39군 사단이 주둔중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우선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이기 위하여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라는 몽골 남부 우므느고비주에 주둔하고있던 몽골군 장교를 중심으로 국경경비대 일부와 남부 주둔군 일부를 매수해 몽골 내부의 반란이라는 인상을 주게 만들었다. 이후 1956년 4월 7일에 일명 장제스 독트린이라 불리는 아시아 민족선언을 발표, 아시아 영내의 외국군 주둔은 오로지 아시아 민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하며 소련을 비난했다. 미국 의문의 1패 그리고 5월 1일, 막샤르사윈 을지바타르의 혁명선언을 필두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내전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가세했고 중국언론들은 이를 공산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디 위한 성전으로 포장했고 각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군을 이끌고 개입을 시작하자 중국은 을지바타르를 사주하여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시켰고 그렇게 약 10만의 중국군 병력이 월경하며 전쟁은 장기전이 되어갔다. 한편 당시 소련에서는 처녀지 개간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력을 처녀지 개간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에 그렇게 큰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고 국내여론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측도 이대로 전쟁을 더 끌기에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협상에 응했고 인도와 한국의 중재하에 울란바로르 협정이 이뤄졌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몽골 민주군 총사령관 및 중국국민의용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몽골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소련 제39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몽골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 해당 협정은 발효된 직후부터 유효하다.
- 해당 협정의 체결이후 소련 및 중국군을 비롯핸 제3국의 군대는 100년간 몽골에 주둔 할 수 없다.
- 몽골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여부는 몽골 인민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 기존 몽골 인민군과 민주군을 통합시켜 신정부 하에 둔다.
- 소련, 중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도 몽골을 자국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몽골 인민의 자주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
몽골 인민군 최고사령관 잠스랑인 삼부 / 소련 제39군 사령원 세묜 부됸니
냉전시대와 현재

정전이후 몽골에는 체제개변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약 5 : 3 정도의 비율로 체제개변이 가결되었으며 국명을 몽골 민주공화국으로의 국호 변경이 확정되었다. 초반에는 소련과 중국의 신경전 속에서 민주적인 체제가 들어서나 했으나 처녀지 개간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소련에 정치혼란이 찾아오자 중국은 의회내 쿠데타를 사주, 친소파 총리를 실각시키고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한다. 그 이후 친중파 몽골 혁명당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가 이루어졌다. 몽골 혁명당은 중국식 중앙집권체제와 대통령제를 표방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했고 실제로 이시기에 몽골에 중공업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또한 높아저 갔고 장제스의 사망으로 1975년에 혁명이 일어나자 몽골 혁명당 정부또한 체제 개변을 선언, 점진적인 민주화를 약속한다. 그러나 민주화가 더디게 진행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이 사건을 1987년 몽골 혁명이라고 불린다. 몽골 혁명이후 혁명당 정권은 무너졌으며 민주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치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리의 힘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우파 -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과 중도좌파 - 사민주의 성향의 인민당이 대립한다. 보수당, 국민노동당, 혁명당등의 정당도 존재하나 큰 영향력은 없다.
입법부
| ||||||||||||||||||||||||||
몽골 국가대회의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는 몽골의 입법부로 단원제 의회다. 26개 선거구에서 48명, 비례대표로 28명을 선출히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외교
한몽관계
중국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건사고와 접점은 없지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몽관계
중국과 유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몽골이니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구 몽골내전의 발단을 중국이 제공했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는 편이다.
몽유관계
전통적인 우방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