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국 국군 군사 계급 | ||||
|---|---|---|---|---|
|
[ 펼치기 · 접기 ]
|
국군의 군사계급은 군인사법에 규정되어있다. 총 25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있다.
軍人事法 [施行 英聖十六年 04. 13.] [法律 제18000호, 英聖十六年. 4. 13., 一部改訂]
第二章 階級 與 兵科 <改訂 . 英聖六年 05. 24.>
第三條(階級) ① 元帥는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1. 大元帥는 皇帝陛下께서 맡으신다. 2. 帝國元帥는 皇太子殿下께서 맡으신다. 3. 國軍元帥는 戰中卓越한 武功을 세운 將星 中 任命한다. ② 將校는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1. 將星: 大將, 中將, 副將 및 參將 2. 領官: 正領, 副領 및 參領 3. 尉官: 正尉, 副尉 및 參尉 ③ 準士官은 先任準位, 准尉, 一等准尉, 二等准尉로 한다. ④ 校官은 特務正校, 正校, 副校 및 參校로 한다. ⑤ 兵卒은 兵長, 上等兵, 一等兵 및 二等兵으로 한다.
원수
대원수
| 대한국 국군 대원수 계급장 | |

|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
대원수(大元帥), (Generallssimo of Korea Imperial Armed Forces)는 대한국 국군 최상위의 계급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가장 최상의 계급임과 동시에 진급만으로 올라갈 수 없는 '진급 외 계급'이다. 대한국의 황제가 겸임하며, 황제는 즉위와 동시에 대한국 대원수 계급을 받으며, 군통수권의 상징적인 기관인 원수부(元帥府)의 수장이 된다. 일반적으로 황태자가 아랫계급인 제국원수 계급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엔 제국원수에서 대원수로 진급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대원수의 직책으로서는 대한국 국군의 통수권자가 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김일성의 난 때부터는 군령권, 군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국군의 상징적인 소유자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
제국원수
| 대한국 국군 제국원수 계급장 | |

|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
제국원수(帝國元帥), (Empire General Korea Imperial Armed Forces)는 대한국 국군 전체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대한국의 황태자가 자동적으로 받는 계급이다. 해당 계급은 원래 '부원수(副元帥)' 라는 명칭이었으나, 여러번의 세계대전과 이로 말미암은 군 수뇌부의 포화와 수관급 장교의 창설로 인하여, 해당 명칭이 적절치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국원수(帝國元帥)'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한중전쟁 당시 황태자이자 제국원수로서 실질적으로 국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던 혜종황제의 영향도 있었다.
제국원수는 상징적으로 육해공군총사령관 직책을 맡는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국군원수
대한국 국군 역대 원수 | ||
|
[ 펼치기 · 접기 ]
| ||
| 대한국 국군 국군원수 계급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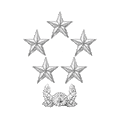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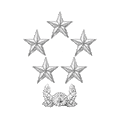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
국군원수(國軍元帥)는 군대 장성급 '장교'의 최고 계급이자 황족이 아닌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다. 해당 계급은 법령상으로는 제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시상황에만 진급이 가능한 직책으로, 실제로 김일성의 난 이후 1951년 이후부터는 진급된 예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군 계급의 독보적인 정점이자 영예라는 특성 때문에 원수 계급은 상당히 정치적이기도 하다. 원수는 일반적인 진급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체제에서 대장 중에 전공이 매우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의정대신이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군원수는 기본적으로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시상황이 끝난 뒤에도 전역 없이 평생 원수의 계급을 유지하면서 군 내에 남아있을 수는 있으나, 예우나 보직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시상황이 끝난 뒤 원수계급인 사람들은 황제 직속기관인 원수부의 추밀위원으로서 활동한다.
크게 육군원수, 해군원수, 해병원수, 공군원수로 4개 군종에서 원수가 나올 수 있으며, 해군의 경우엔 대제독이라고 칭한다. 현재까지 육군에서는 6인의 원수가, 해군에서는 해병까지 포함하여 3인의 원수가 있었으며, 공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3인의 원수가 존재하였다.
군사정변을 통해 의정대신을 지낸 박정희, 전두환 또한 당시에는 원수계급으로 특진 뒤에 예편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이회창 정권 당시 진급이 취소되었다.
장교
장성급 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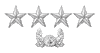 대한국 국군 현직 대장 | ||
|
[ 펼치기 · 접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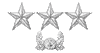 대한국 국군 현직 중장 | |||||||||||||||||||||||||||||||||||||||||||||||||||||||||||||||||
|
[ 펼치기 · 접기 ]
| |||||||||||||||||||||||||||||||||||||||||||||||||||||||||||||||||
| 대한국 국군 장성급 계급 | |||||||
| 대장(大將) | 중장(中將) | 부장(副將) | 참장(參將)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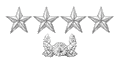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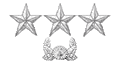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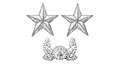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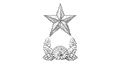
|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
영관급 장교
| 대한국 국군 영관급 계급 | |||||
| 정령(正領) | 부령(副領) | 참령(參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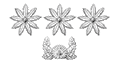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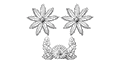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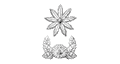
|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
위관급 장교
| 대한국 국군 위관급 계급 | |||||
| 정위(正尉) | 부위(副尉) | 참위(參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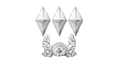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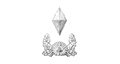
|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해군 견장 및 수장 | |||
준사관
| 대한국 국군 준무관 계급 | |||||||
| 선임준위(先任准尉) | 일등준위(一等准尉) | 이등준위(二等准尉) | 삼등준위(三等准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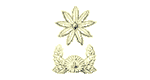
|
파일:대한국 선임준위 계급장.p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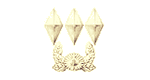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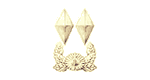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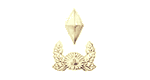
|
|||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 | 정장, 약장 및 견장 |

| |||||||
| 해군 견장 및 수장 | |||||||
부사관
| 대한국 국군 교관 계급 | |||
| 특무정교(特務正校) 병조장(兵曹長) |
정교(正校) 상등병조(上等兵曹) |
부교(副校) 일등병조(一等兵曹) |
참교(參校) 이등병조(二等兵曹) |

|

|

|

|
| 모장,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정장, 약장 및 견장 | 모장,정장, 약장 및 견장 |
병
| 대한국 국군 병사 계급 | |||
| 병장(兵長) 삼등병조(三等兵曹) |
상등병(上等兵) 선임수병(先任水兵) |
일등병(一等兵) 일등수병(一等水兵) |
이등병(二等兵) 견습수병(見習水兵) |
| 정장, 약장 | 정장, 약장 | 정장, 약장 | 정장, 약장 |
병사(兵士)는 장교와 부사관 아래 신분인 병을 일컫는 말이다. 각 군종별로 칭하는 명칭이 다른데, 육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병사, 해군은 수병', 해병은 해병이라고 하며, 1950년 전까지는 졸(卒)이라고 칭하였으나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다는 이유로 바뀌었다.
모병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징병제 국가의 특성상, 진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작업이나 작전에서 천대받거나 각종 군인혜택등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엄연한 국군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부분에서 선진적이고 자율적인 병영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대표적으로, 영내거주의 의무가 일등병까지로 제한되었으며, 이 마저도 과거 군대와 같이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내무실을 쓴다거나 하는 형식이 아닌, 최대 2인 1실의 형태로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
또한 자동적으로 병장까지 진급이 이뤄지던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실적위주의 진급체계가 잡히면서, 상등병부터 사실상의 군간부취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례로, 여러 국군의 정보체계의 관리자 권한을 보면, 상등병을 기준으로 권한이 '열람자'에서 '사용자'로 전환이 되며, 사격훈련 등에서도 각종 복잡한 안전절차가 생략된 '실전사격전훈련'을 수료할 수 있게 된다.
기타
다음의 신분들은, 양성과정의 인원으로 취급하기에, 신분상 준군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관, 수료 전 까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중도포기 후 나갈 수 있다. 무관생도 및 무관후보생의 서열은 준무관 다음으로, 교관후보생은 교관 다음으로한다.
- 무관생도
- 무관후보생
- 학군무관후보생
- 준무관후보생
- 교관후보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