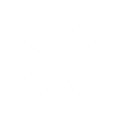| ||||||||||||||||||||||||||||||||||
|---|---|---|---|---|---|---|---|---|---|---|---|---|---|---|---|---|---|---|---|---|---|---|---|---|---|---|---|---|---|---|---|---|---|---|
국가 정보
정치
경제
군사
 정치 US Politics
| |||||||||
| 행정부 Administration | 이름 | 정당 | |||||||
| 대통령(President) |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John Fitzgerald Kennedy |
DP-민권파 | 
| ||||||
| 부통령(Vice President) | 린든 베인스 존슨 Lyndon Baines Johnson |
DP-반독파 | 
| ||||||
|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 딘 러스크 Dean Rusk |
관료-국제파 | 
| ||||||
| 재무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 클라렌스 더글러스 릴런 Clarence Douglas Dillon |
관료-국제파 | 
| ||||||
|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se) | 로버트 맥나마라 Robert McNamara |
관료-반독파 | 
| ||||||
|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 Robert Francis Kennedy |
DP-민권파 | 
| ||||||
| 내무장관 (Secretary of the Interior) | 스튜어트 우달 Stewart Udall |
DP-국제파 | 
| ||||||
| 농무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 오빌 프리먼 Orville Freeman |
DP-민권파 | 
| ||||||
|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 | 루터 호지스 Luther Hodges |
DP-국제파 | 
| ||||||
| 노동장관(Secretary of Labor) | 아서 골드버그 Arthur Goldberg |
DP-민권파 | 
| ||||||
| 보건복지교육장관(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에이브러햄 리비코프 Abraham Ribicoff |
DP-민권파 | 
| ||||||

개요
- 1928 허버트 후버
- 1929년 10월 대공황 발생 이후 균형예산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앤드류 멜론 재무장관이 11월 피습으로 사망. 이후 후버 행정부는 기존의 시도를 벗어나기 위해 연방농민위원회의 헨리 모겐소 주니어를 재무장관으로 임명. 1929년 말 무주택자를 위한 후버빌 건설 시작, 후버빌 거주자를 상대로 푸드스탬프 도입. 1930년에는 후버댐 건설을 지시하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의 시장"을 강조. 이는 남부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옴. 연준은 영프의 블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 후버빌 건설과 일시적인 주택보증이 시작되면서 주택경기가 돌아옴. 1931년 FDR은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며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 1932년 실물경기지표가 회복되며 대공황 종식 선언. 1930년 제1차 런던해군군축조약에 조인 이후 국방비의 일부를 재건지출에 활용.
- 1932 허버트 후버 v. FDR
- 후버가 남부와 대평원의 지지를 잃었지만 도시권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 1931년 워싱턴해군군축조약 주도 1934년 무역자유법을 가결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관세부과를 거부하고 일률적 관세를 적용, 자유무역기조를 강화.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위협한다며 거부권 행사. 1936년 제2차 런던해군군축조약도 체결. 유럽의 상황을 주시하기는 했지만, 독일이 크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음. 독일의 성장을 방관. 블록경제로 영프가 시장을 닫자 오히려 차관을 빌려주며 대공황 탈출에 도움을 주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주도함.
- 1936 알프 랜던 v. FDR
- 랜던은 후버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 랜던은 재정보수주의자였지만, 대공황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믿었다. 후버 대통령은 암살이 두려워 뒷걸음질치다 대공황을 잡았지만, 근본적으로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의 2번째 임기는 사회보장지출을 축소하고, 후버댐과 같은 대규모 건설부양책은 지양되었다. 랜던은 집권 직후 후버 대통령이 점차 중단을 시사한 후버빌의 건설을 도시권에서 중소도시로도 확대하고, 후버빌 거주자를 위한 푸드스탬프 제도를 도시권 실업자까지 확대하였다. 물론 1937년을 지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보수주의 의원들에 의해 그의 프로그램은 일부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1938년의 약한 불황을 겪었지만, 대규모 실업이나 도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확실히 대공황에서 벗어났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랜던 대통령은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중립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독일에 미국이 싸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AFC(America First Committee)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중립법은 결국 통과되었다.
- 1940 알프 랜던 v. 존 낸스 가너
- 40년 대선은 랜던 대통령의 무난한 승리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FDR보다 강경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신봉자였으며, 남부와 기업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남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랜던 대통령 때 후퇴한 균형예산의 복구와 전쟁중인 유럽을 대상으로하는 대금업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영국은 분노했으며, 공개적으로 가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랜던은 균형예산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평시의 이야기라며 "평시-비상" 개념을 주장했다. 이러한 랜던의 주장은 지난 29년 이후 자행된 공화당 정부의 정책을 도식화한 것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 결국 가너는 남부와 일부 대평원 주에서의 선거인단을 얻고 선거에서 참패했다.
- 랜던 대통령은 무난히 공화당 경선에서 다시 지명될 수 있었다. AFC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경선에서 재지명되었기 때문에, 1941년 중순 발의된 랜드리스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랜던 대통령은 AFC에 영국에 대한 5억달러 차관 동의를 요청했으며, AFC도 이를 동의해 영국에 대한 자금지원만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러한 고립주의 기조는 일본에 의한 진주만 공습 이후 완전히 파괴되었다. AFC는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모임이었지만, 일본에 맞선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AFC의 얼굴 찰스 린드버그의 공군 대령 복귀를 허가해 그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맞서 출격하는 것을 용인했다.
- 한편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1942년 미독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독소전이 발발했을 때도 나치독일과의 무역을 유지해 랜던은 반대자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영국은 비난 일색이었지만, 랜던 대통령이 차관을 10억 달러로 상향하고 영국에만 랜드리스를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ABCD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참여국들의 지휘체계 통일을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 어니스트 킹을 사령관으로 추대해 해군을 하나의 명령체계로 통합했다. 이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내에 반드시 일본과 잔당을 점령하기 위해서 육군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했고, 1943년 초 아시아 원정군이 사령부 휘하에 설치되어 원정군 사령관이 되었다.
- 1944 알프 랜던 v. 헨리 A. 월리스
- 44년 대선은 랜던 대통령의 사상초유의 3선이 일어났다. 랜던 대통령은 세계대전을 끝내고 미국을 안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며 3선에 출마했다. 당 내에서의 반발은 굉장히 컸지만, 랜던 대통령에 맞설 사람들이 부족했다. AFC는 일본에 맞선 전쟁에 온 신경이 쏠려있었고, 군부의 랜던에 대한 충성도는 압도적이었다. 군부 내의 사실상 유일한 반독파 맥아더는 태평양 전선에서 몸을 불사르고 있었다. 그의 3선은 논란을 점화시켰지만, 민주당에서 상대로 나온 월리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이단아였기 때문에 랜던 대통령의 3선은 사실상 확실했다. 월리스는 전쟁와중에도 흑인민권을 외치는 전형적인 리버럴이었고, 일본에 공격받은 미국을 이끄는 랜던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1945년 2발의 원자력탄 투하 이후 일본은 어니스트 킹의 GHQ에 의해 통제된다. 1945년 8월 미국은 여론에 떠밀려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이 패망하자 정전회담을 시작, 1946년 런던에서 강화조약을 맺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다. 맥아더는 1946년 국무장관으로 입각해 맥아더 플랜을 제시했다.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골자로하는 이 계획은 랜던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맥아더는 일찍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해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들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맥아더의 이러한 기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화당 친일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 1948 찰스 린드버그 v. 스트롬 서먼드
- 1948년 대통령 선거에 맥아더가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는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영웅 찰스 린드버그가 공화당에서 입후보를 선택하면서 그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의 친독성향을 비판했다. 특히 랜던 대통령과 린드버그 후보자가 영국과 함께 일본에 맞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공격한 독일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후보가 바로 서먼드 후보였다. 서먼드는 독일이 다가오는 50년대에 반드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대서양불안정론을 제시했다. 서먼드가 처음 후보로 나와 경선에서 이를 주장했을 때는 민주당 내의 국제파와 민권파에 의해 무시되었지만, 전국순회 경선이 시작되자 일본에 이어 독일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위협론이 부상했다. 위협론의 부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독일의 원자력탄 실험 성공 소식이었다. 이후 유세마다 서먼드는 옛 브레스트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가 워싱턴 dc를 폭격하는데 12시간이면 미국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운명의 12시간"을 떠들고 다녔다. 린드버그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전쟁을 끝났다며,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 등, 전쟁을 직접 겪은 퇴역군인으로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의 국제파와 민권파가 모두 경선에서 패배당하고, 서먼드의 반독파가 이 때 당을 장악한다. 한편 랜던 대통령과 공화당 행정부는 이런 기류를 딱히 신경쓰지 않았다. 정확히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자신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기 때문에 재집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영국과 호주에 막대한 전후복구 자금을 지원하고도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전후 불황을 예상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랜던 대통령의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선거일인 1948년 말이 다가오면서 전쟁 당시 수준의 호황에 익숙해져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침체는 공황처럼 느껴졌고 공화당 정부에 대한 지지는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과 함께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쟁영웅 린드버그가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사람들은 일본에 맞선 전쟁에 이긴 린드버그보다, 독일에 맞설 전쟁을 대비하는 서먼드에 안정감을 느꼈다.
- 1948년 대통령 선거는 많은 신문의 접전 예상과 달리 서먼드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서먼드는 기존의 남부 주 뿐만아니라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과 같은 대도시권에서도 아슬아슬하지만 승리를 쟁취했다. 이 당시 민주당의 반독성향이 강해졌으며,
- 1952 토마스 E. 듀이 v. 스트롬 서먼드
- 1952
- 1956 더글러스 맥아더 v. 필딩 L. 라이트
- 1960 더글러스 맥아더 v. 존 F. 케네디
- 1964 넬슨 록펠러 v. 로버트 F. 케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