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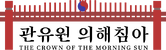 | |
|
[ 국가 목록 ]
[ 소개 ]
|
근대원격제도(近代院格制度) | ||||||||||||||||||||||||||||||||||||||||||||||||||||||||||||||||||||||||||||||||||||||||||||||||||||||||||||||||||||||||||||
|---|---|---|---|---|---|---|---|---|---|---|---|---|---|---|---|---|---|---|---|---|---|---|---|---|---|---|---|---|---|---|---|---|---|---|---|---|---|---|---|---|---|---|---|---|---|---|---|---|---|---|---|---|---|---|---|---|---|---|---|---|---|---|---|---|---|---|---|---|---|---|---|---|---|---|---|---|---|---|---|---|---|---|---|---|---|---|---|---|---|---|---|---|---|---|---|---|---|---|---|---|---|---|---|---|---|---|---|---|---|---|---|---|---|---|---|---|---|---|---|---|---|---|---|---|
[ 펼치기 · 접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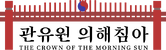 | |
|
[ 국가 목록 ]
[ 소개 ]
|
근대원격제도(近代院格制度) | ||||||||||||||||||||||||||||||||||||||||||||||||||||||||||||||||||||||||||||||||||||||||||||||||||||||||||||||||||||||||||||
|---|---|---|---|---|---|---|---|---|---|---|---|---|---|---|---|---|---|---|---|---|---|---|---|---|---|---|---|---|---|---|---|---|---|---|---|---|---|---|---|---|---|---|---|---|---|---|---|---|---|---|---|---|---|---|---|---|---|---|---|---|---|---|---|---|---|---|---|---|---|---|---|---|---|---|---|---|---|---|---|---|---|---|---|---|---|---|---|---|---|---|---|---|---|---|---|---|---|---|---|---|---|---|---|---|---|---|---|---|---|---|---|---|---|---|---|---|---|---|---|---|---|---|---|---|
[ 펼치기 · 접기 ]
|
| 언어별 명칭 | |
|---|---|
| 한국어 | 근대원격제도 |
| 한자 | 近代院格制度 |
| 영어 | Modern system of ranked Seowon |
1885년부터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재개편된 서원 시설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제도.
'근대원격제도'란 명칭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일전에 실행했던 사액서원 제도와 대조하여 '근대'에 나온 제도라고 후대에 이름을 붙인 용어이다. 이 때문에 근대원격제도란 용어에 대응하녀 19세기 이전에 사액서원 제도를 '중세서원제도'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1]. 이마저도 19세기 이전에 일부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지정하여 명예를 준 것이지, 그 이전까지 조선 왕조가 원격제도라고 부를 만큼 세밀한 위계질서를 만들어 관리한 것은 아니다.
본래 대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이래 유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 향교와 서원을 설치하곤 했는데, 통상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육기관인 서원의 경우 성현이라 불리는 인물을 배향하고 생전 해당 인물의 사상을 반영하여 유학을 교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성현은 단순히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배향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원 내에서 유학에 관하여 다양한 입장과 사상을 가진 분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17세기 중후반부터는 서인, 노론의 일부 파벌을 시작으로 서원의 폐단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유학에서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학파들의 경우 지나치게 하나의 서원에 많은 성현이 경전을 탐구하는 것에 방해가 될수도 있다는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근세에 들어서는 서원들의 폐단이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성현의 배향 수를 제한해 제사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여기는 흐름도 나타났다. 북학파, 남학파나 당시는 소수였던 개화파등도 이에 동조하였고, 세도정치 속에서 개혁을 꿈꾸는 계열의 인사들 또한 서원제도의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임신대경장 이후 서원들이 폐단이 혁파되고, 국체유학이 사상적으로 건설되면서 한국의 유학관과 혼합되기 시작했다.
1875년경부터 이미 한성과 지방의 서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서원들의 폐단을 혁파한다는 명분 하에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데 이래, 귀정성리학의 사상적 정립이 거의 완성된 1885년에 대한국 정부는 정식으로 향원관을 창설, 중앙정부에서 서원에 개입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사실상 앞으로 중앙정부가 기존까지 향촌과 지방의 관할 업무였던 관외 서원의 관리까지 전부 책임지겠다는 의사표명이였고, 이렇게 서원에서 계속 중앙의 권위를 부각시켜 직간접적으로 백성들이 죽어서나 살아서나 오로지 나라와 황실만 바라보게 의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인 향례제의 규모, 의미가 대폭 개편됐다. 대한국 정부가 향례제에 새롭게 부여한 역할은 일종의 지역축제였는데, 이는 국체유학에 대한 서민들의 거부감을 정식 선포 이전에 최대한 낮추는 한편, 행사를 늘려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이였다. 처음엔 유생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많았으나 결과는 대성공이였고, 그렇게 '엄격한 원리와 자유로운 구조'라는 근대적인 유학의 정립이 서민 사회에도 뿌리내렸다.
1885년에 4월 중순, 대한국 정부는 공식으로 서원에 격을 매기는 '원격제'를 도입했다. 일정 격 이하의 서원에는 배향할 수 있는 현인들의 수를 제한하여 부패를 확실하게 줄이고, 대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소형 서원과 위상이 상승한 향교의 수를 늘려 국체유학이 빨리 퍼지도록 기능하게 했다. 당연히 유생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많았지만 송시열의 이론에 따른 주자학적 논리[2]에서 봐도 문제가 없는 행위였던데다가 오히려 체제적으로는 훨씬 혁신적이였고, 떄문에 유생들이 낸 주장의 위력 본래만 못했다. 여기에 근대원격제도로 지방서원들이 전부 중앙의 관할에 들어가자 서원의 횡포로부터 숨이 트인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유생들에게 엄포를 놓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와 같은 배경과 19세기에 들어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들어오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개혁과 서구화를 거친 한국의 정치체제 또한 근대적인 재상제도를 구축했다.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변화된 사회에서는 근대원격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서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조직화가 가능했다. 이는 부국강병을 위해 개편한 국체유학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제도적 기반이기도 했으며, 종전 이후 1946년 연합군 통감청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대원격제도를 폐지하였지만, 격이 높았던 서원은 여전히 대우받는다. 과거에 격을 받았던 서원는 관련 자료에서 '구 서원격(舊書院格) 〇〇書院'라고 알려주는데, 바로 근대원격제도에서 받았던 등급을 말한다. 홍살문 앞 표석에 옛 서원격을 새긴 곳도 많다. 비록 제도가 폐지되긴 했어도 과거에 높은 격을 받았던 서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대접받는다. 예시로, 현재까지도 유명했던 서원들은 수능 전인 고등학생들이 합격 기원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인기를 가진 상태다.
아무 격도 받지 못한 작은 서원를 무격서원(無格書院)라 했는데, 혁파 이후 부패한 유생들이 많이 사라진것의 여파로 한국 전체에 있는 서원들 중 절반 이상이 무격서원였다. 무격서원이 새로이 격을 받거나, 또는 이미 격을 받은 서원이 또다시 다른 격을 받는 것을 열격(列格)이라고 하였다.
궁내부에서 지정한 바에 따르면 크게 서원의 격은 국제원(國祭院)과 궁제원(宮祭院)으로 나뉘었다. 이 중 국제원은 한국 정부의 지출로 전폐(奠幣)의식을 치루어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궁제원은 궁(宮), 즉 황제의 일족이 속하는 한국 황실의 궁(정확히는 궁내부지만)의 내탕금을 직접 지불하여 제례에서 전폐(奠幣)의식을 거행했다.
가장 높게 취급된 시설은 역대 대한 황실의 황족들과 왕족들의 위패가 안치된 종묘였다. 근대원격제도 하에서 종묘는 한국과 조선의 선왕, 즉 유교에서 중시하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서 인을 널리 행한 인물인 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가장 존엄한 곳이라 하여 아예 서원격을 매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종묘에 서원격을 매긴다 어쩐다 하는 행동 자체를 무례하게 여겼으므로, 종묘는 '등급 외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를 증명하듯이 황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다만 임신대경장 이전까지의 종묘는 궐 밖에서까지 그 권위가 강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광무 시대 대한국 정부가 당시에 이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500년동안 내려오는 한국 황실의 지엄함과 역사를 중요시하게 만드는 풍조를 조성하려는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궁국제원(宮國祭院) | ||||||||||||||
| 궁제정원 | → | 국제정원 | → | 궁제부원 | → | 국제부원 | → | 궁제참원 | → | 국제참원 | ||||
| 宮祭正院 | 國祭正院 | 宮祭副院 | 國祭副院 | 宮祭參院 | 國祭參院 | |||||||||
침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한 권위를 가진 종묘의 밑으로는, 크게 궁제원(宮祭院)과 국제원(國祭院)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정(擎)·부(副)·참(參)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제(祭)는 제례(祭禮)를 뜻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 제례에서 사용되는 비용과 예물을 통틀어 전폐(奠幣)라고 칭하여 불렀다. 궁제원은 한국 황실(구체적으로는 궁내부)에서, 국제원은 대한제국 정부에서 전폐의식을 거행했다.
크게 궁제정원(宮祭正院)·국제정원(國祭正院)·궁제부원(宮祭副院)·국제부원(國祭副院)·궁제참원(宮祭參院)·국제참원(國祭參院) 등의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제 1차 극동전쟁이 끝나고 몇년간의 시간이 지난 1897년부터 대한제국 정부는 별개로 별격궁제원(別格宮祭院)이라는 등급을 신설하고 궁제참원에 준하여 대우하기로 했는데, 이 별격궁제원은 민족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자'를 성현, 혹은 성철로 모시는 서원 중에서 선별했다. 1946년 근대원격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총 15개 시설이 별격궁제원이 되었는데, 그 중 만주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한성에 설치되어 만주 전선에서 전사한 흥안군을 배향한 한성 충장서원이다. 충무공 이순신을 성현으로 모신 현충사 또한 별격궁제원이였다.
식민지 만주의 경우 궁제정원은 경호자치도 심양부(現 묵던특별시)에 위치한 장백사와 관성부(現 창춘광역시)의 선관서원, 예허북도 합이빈부(現 하르빈광역시)에 위치한 천힐서원을 비롯한 3곳, 국제참원은 대략 31곳이 존재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졌는지 그 외에도 발해사가 천힐서원의 뒤를 이을 새로운 궁제정원으로 정해졌고 이후 착공에 돌입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대한제국이 항복하자 몇개월 뒤 근대원격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해체되었다.
게다가 선관서원은 1923년경 관성대화재로 인해 불타버렸고, 따라서 만주가 독립할때까지 실질적으로 성현에게 제사를 드리고 유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서원은 장백사와 선관서원정도였다. 식민지 만주에는 궁제정원과 국제참원을 포함한 서원 31곳을 제외하면 서원이 없었고, 그마저도 한국의 서원 문화에 생소한 만주인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기 일수였다. 때문에 만주총독부 측에서도 만주의 각 도(道)마다 국제참원을 하나씩 두려고 노력하였으나, 계획을 완수하기 전에 한국이 항복하면서 백지가 되었다.
| 내지제원(内地諸院) | ||||
| 부원(府院) | → | 군원(郡院) | → | 현원(縣院) |
| 도원(道院) | 구원(區院) | 방원(坊院) | ||
| 목원(牧院) | 면원(面院) | |||
| 외지진원(外地眞院) | ||||
| 도진원(道眞院) | → | 주진원(州進院) | → | 현진원(縣眞院) |
| 부진원(府眞院) | ||||
서원은 각각 도(道)·부(府)·군(郡)·구(區)·목(牧)·현(縣)·방(坊)·면(面),즉 각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시로 한성을 대표하는 서원은 한성 부원(漢城府院)인 식이다. 이러한 제원의 급은 한국 본토에서 통용되는 관계로 내지제원(内地諸院)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식민지였던 만주의 행정체계는 대한제국 본토와 상이했으므로, 제사(諸院) 등급으로는 만주총독부가 따로 도진원(道眞院)·부진원/주진원(府眞院/州進院)·현진원(縣眞院)를 지정하여, 각 도·부/주·현이 공금으로 신사의 유지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서 진(進)은 '진상'이란 뜻이다. 따라서 도진원·부진원·주진원이란 명칭은 '도·부·주에서진상하는 서원'이란 뜻인 셈인데. 여기서 내지와 다르게 똑같이 제사를 지냄에도 제사의 제(諸)자가 붙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현재 사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나, 보편적인 학설은 당시 대한제국 기준 식민지인이자 미개한 민족인 만주인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 성현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작명이라는 설이다.
치제원 문서 참조.